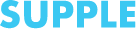심각한 질병이고 비만으로 인한 혈관질환등으로 이어지기 전 치료 괜찮다고 봅니다
대한비만학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나온 한 마디 "비만약 급여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서영성 학회장의 이 말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국내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이고, 20-30대 젊은 남성의 비만율은 10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이 중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뇨병과 고혈압, 각종 암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의료시스템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비만을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미용 문제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1997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등장은 이런 인식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월 30만원이 넘는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의료접근성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력에 따라 건강 결과가 달라지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급여화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는 재정 부담이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 사고다. 비만 환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1.9배, 당뇨병 유병률이 2.1배 높다는 것은 미래의 의료비 폭증을 예고하는 신호다.
한 명의 비만 환자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게 되면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면 급성기 치료비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든다. 예방 1원이 치료 10원보다 효율적이라는 보건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무조건적인 급여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이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비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다. 단기적 재정 부담을 우려해 손을 놓고 있다가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것이다.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비만 치료제 급여화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비만의 늪에 빠지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