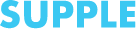우리나라는 루시의 비극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죠... 아무리 개농장의 악행을 알려도 결국은 사람들은 품종견을 사고요... 우리나라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ㅠㅠ
2013년 영국의 한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 '루시'. 수년간 좁은 철창에 갇혀 끊임없는 임신과 출산을 강요받았던 개는 구조 당시 척추가 휘어져 있었고, 털은 빠져있었으며, 만성 안구건조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루시는 구조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개의 이름을 딴 '루시법'은 2020년 영국에서 시행되어 펫숍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한 마리 개의 비극이 한 나라의 법을 바꾼 것이다.
EU 의회가 지난 6월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을 가결하면서, 조만간 EU 전역에서 펫숍의 개·고양이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이미 2024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고, 스페인 역시 같은 해 9월부터 펫숍에서의 개·고양이 판매와 전시를 금지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가 동참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펫숍 판매는 금지하되, 보호소나 구조센터에서의 입양은 적극 장려한다는 것이다. 즉, '사고파는' 관계에서 '책임지고 입양하는' 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전히 번화가 펫숍에는 유리창 너머로 새끼 강아지들이 전시되어 있고, 온라인에서는 '즉시 분양 가능'이라는 광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산의 불법 강아지 번식장, 경기도의 대형 번식업체 적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변화는 미미한 상황이다.
물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번식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사고파는 방식은 아직 진전이 없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단순히 펫숍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 양육 책임 확인서' 제도를 도입했다. 입양자는 평생 책임지겠다는 서약과 함께 기본적인 양육 지식을 확인받아야 하고, 7일의 숙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는 충동적인 입양을 방지하고,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쁘다'는 감정적 판단이 아닌, '책임질 수 있다'는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펫숍 규제는 단순히 업계 규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다.
독일이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2002년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신설한 것처럼, 우리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다.
반려동물을 '사는' 것이 아닌 '입양하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펫숍 유리창 너머의 새끼 강아지를 보며 "귀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의 어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루시 한 마리의 눈물이 영국을 바꿨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는 GDP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함께해야 한다.